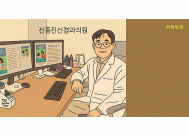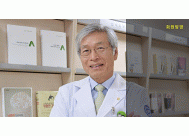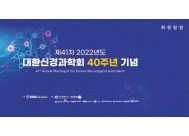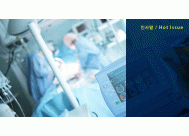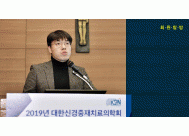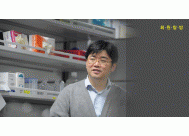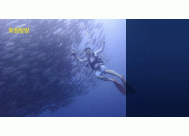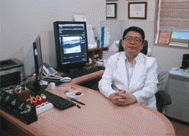김재우 교수님 퇴임소감과 향후 계획
1. 김재우 교수님의 정년을 축하드립니다. 동아대병원을 이끌어 오시고 신경과 학회 일원으로서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년을 맞이하신 것에 대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1990년 3월 서울대학교병원 전임의를 마치고 고향에 내려와서 정년을 맞이하기까지 30년이 조금 지났군요. 당시에 내려올 때는 많이 망설였습니다. 지방과 서울의 격차가 큰 상황에서 자기개발에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지방이 가지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은 더 많은 노력으로 극복해야 했습니다. 지금 뒤돌아보면 같이 근무하는 동료 후배 교수들과 우리 의국을 마치고 나간 동문들의 많은 협조와 노력으로 큰 어려움 없이 지금의 신경과 모습을 유지하게 된 데 대해 많은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2. 교수님께서 많은 전문과목 중에 신경과를 선택하시게 된 계기와, 신경과 파트 중에서도 이상운동질환(파킨슨)을 전공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요?
직업에 귀천이 없듯이 어떤 진료과를 전공하더라도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인간 전체를 보고 고민하면서 함께 치료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의사가 되기 위하여 신경과를 선택하였습니다. 대학에 들어오면서 가능하면 많은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싶어 불교학생회라는 동아리에 참여하였고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의사로는 정신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본과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운 지식을 환자들에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커다란 괴리감을 발견하고는 정신과를 포기하였습니다. 무슨 과를 할까를 고민하던 중 당시 신경과 1년차였던 김주한 선생님이 해머 하나만 달랑 들고 응급실로 내려와 이해할 수 없는 몸짓으로 환자를 보는 모습이 의과 대학생이었던 저의 눈에는 그렇게 멋있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외과 의사와 달리 어차피 내과 계열의 의사는 점쟁이인데 내과 의사가 50%의 확률로 진단을 내린다면 신경과는 80%의 점쟁이 의사라는 선배의 이야기에 공감을 하여 신경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전공의 1년차때 의국 서적을 정리하면서 “Basal Ganglia”라고 커다랗게 쓰인 제목의 서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병아리 신경과 의사로서 뇌의 신비로움에 하나하나 눈을 뜨는 과정이었지만 “Basal Ganglia”에 대해서는 전혀 상상이 가지 않고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외부와의 출입을 자제하고 전공의 과정을 거의 병원에서 지내면서 임상환자진료에 많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던 중 전공의 2년차 때 병실에서 처음 보는 환자를 접하게 되었는데 ‘Hereditary progressive dystonia with marked diurnal fluctuation’ (지금의 Dopa-responsive dystonia)이라는 긴 병명을 가진 환자를 국내에서 처음 발견하고 보고한 것이 이상운동질환을 전공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타의 신경과 환자들과 달리 레보도파 한조각에 dramatic response를 경험할 수 있었고 이것은 저에게 아주 충격적이면서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흔히들 신경과 환자들은 약제에 반응을 잘 하지 않아 외부에서 보기에는 치료가 잘되지 않는, 답답해하는 과이지만 그래도 movement disorders 환자들은 매우 dynamic 하면서 다른 과들뿐만이 아니라 인접한 정신과나 신경외과에서도 전혀 접근하기 힘든(지금은 deep brain stimulation이라는 치료를 위해 신경외과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가장 신경과적이라는 점이 매력이었고 동시에 자부심을 가지며 진료할 수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3. 세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억에 남는 환자, 기억에 남는 제자, 교직 생활 중 기억 남았던 일, 동아대병원 파킨슨센터 소장으로서의 기억에 남는 일 등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3-1) 아무래도 국내에서 제가 처음 발견한 질환을 가진 환자들과 관련된 일들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Dopa-responsive dystonia 외에도 Gerstmann-Strausler-Scheinke disease, Niemann-Pick disease type C, Episodic ataxia type 1 같은 질환들을 찾아내는 과정 중에 고민하고 겪었던 갈등들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전혀 환기시설을 갖추지 못한 작업장에서 망간 광석을 부수는 일을 하면서 파킨슨병에 걸린 환자 (Manganese parkinsonism)도 오랫동안 잊어버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환자는 부산에서 멀리 떨어진 충청북도 영동군에서 거주하였는데 몇 번 직접 찾아가 진료하고 그가 일했던 작업장을 방문한 후 환자를 일본으로 데려가 그 당시 국내에서는 시행할 수 없었던 F-18 Fluoride PET scan을 시행하여 그 사실을 바탕으로 증례를 보고하고 오랫동안 질병의 경과를 추적했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작업환경이 좋아진 우리나라에서 다시는 그 특징적인 환자의 모습을 보지는 못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3-2) 동아대학교병원 개원 당시 신경과를 처음으로 set-up 해야 하는 열악한 과정에서 함께 고통을 분담해 준 의국 초창기의 제자들이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은 같은 동료 교수로서 혹은 개원의로서 활약을 하면서 가끔 만나서 친구처럼 지낼 때가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3-3) 동아대학교병원 파킨슨병센터는 2005년에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문을 열었고 당시에 DBS 장비가 갖추어 있지 않아 첫 환자를 인근 병원으로 옮겨 직접 시술하였고 환자들과 가족들을 모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또한 파킨슨병 운동센터를 열어 다양한 운동을 통해서 질병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4. 교수님께서 요즘 관심 있는 분야는 어떤 것인지요?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따로 없고 제가 전공하는 분야의 update 한 지식들을 따라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5. 교수님의 정년 후의 삶은 현재 남은 교수들뿐만 아니라 다른 신경과 의사들도 궁금해합니다.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은퇴 후의 일들을 계획하면서 늘 느끼는 점은 모든 관심 있는 일들은 정신과 체력이 버텨줄 수 있는 젊었을 때 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헐렁한 고무줄 바지를 입고 빠듯한 스케줄에 얽매어 살지 않아도 되는 지금은 제가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특권의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평소 시간에 쫓겨 하지 못하였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려 합니다. 시간 나는 대로 우리나라 곳곳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둘러보고 그 지방의 특색 있는 음식들도 즐겨 볼 생각입니다. 가깝고도 먼 일본을 이해하고 장기간 여행하기 위한 준비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도 직접 만들어보고 세상살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남들이 다 말리는 주식에도 조금 투자해 볼 생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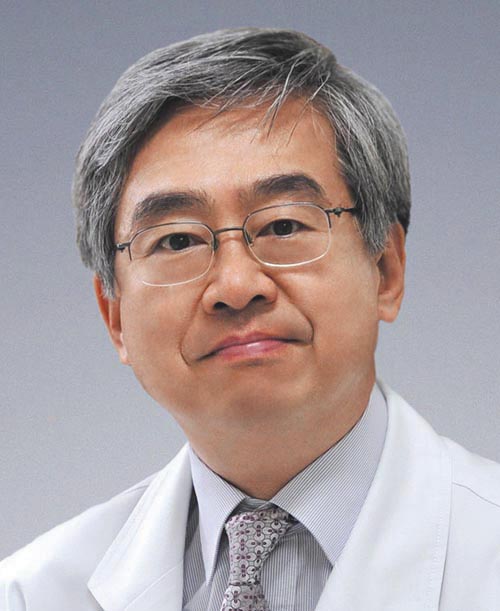
6. 마지막으로 후학들에게 특히 신경과 의사의 길로 들어선 전공의들에게 멋진 신경과 의사가 되지 위한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신경과 의사로서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삶의 수단만으로 분리해서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무겁고 숭고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직업 속에서 우리는 재미와 보람을 함께 느끼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진료과의 귀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루 종일 귀속을 들여다보고 피부만을 보면서 직업적인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좀 더 인간 전체를 보고 고민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 노력하는 과정이 훨씬 더 아름답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될 자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