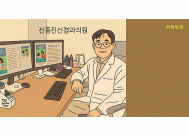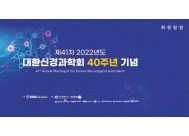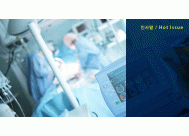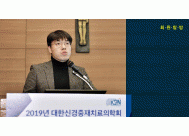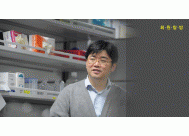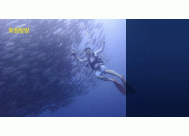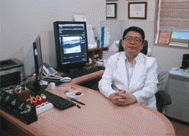이병인 교수님 INTERVIEW
이병인 교수님, 대한신경과학회보 구독자들에게 간단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학회 회보를 통해서 회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회원님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모든 방면에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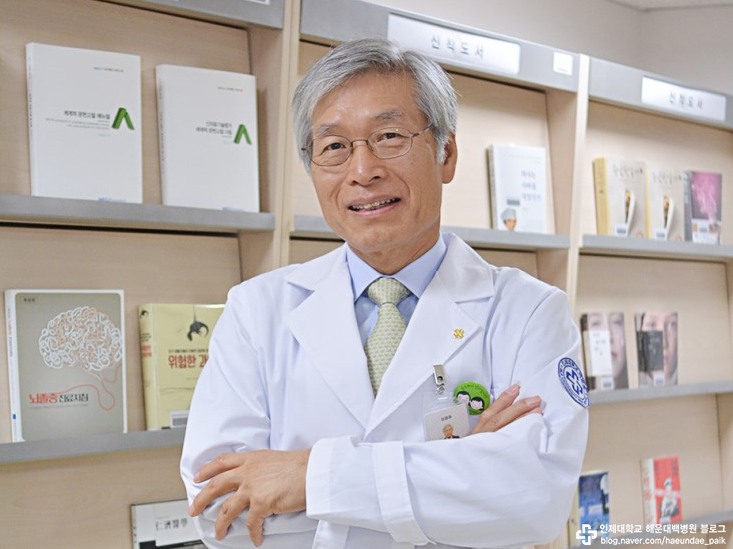
저는 1974년에 연세 의대를 졸업하고, 1978년에 도미하였다가 1988년 9월에 귀국하였습니다. 1989년 3월부터는 명호진 교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학술이사로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당시에는 학회가 마치 가족 같은 분위기여서 학술대회의 내용이나 형식을 바꾸는 것도 쉬웠고 학술이사 단독으로 알아서 진행해도 오히려 많은 협조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학회는 거대 조직이 되어서 가이드라인 대로 하지 않으면 여기 저기 말도 많고 사단도 많은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학회는 그 동안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거듭했지만, 그에 걸맞는 문제점과 단점을 가질 수 밖에 없으며, 특히 신경과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그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고 새로운 개념과 분야들이 급격히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적응할 만한 유연성과 인재들을 두루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회의 조직이 더욱 세밀하게 분화되면서도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유기적인 체계가 필요하며 또한 이 모든 발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재정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결국 학회를 비롯하여 우리 사회의 모든 조직이나 기구들이 기업화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학회의 성공적인 기업화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결국 학회의 기본 목표인 회원간의 친목과 존중을 확보하면서 중견과 신진 회원들간의 교류와 소통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며, 학회보의 중요성은 더욱 더 부각될 수 밖에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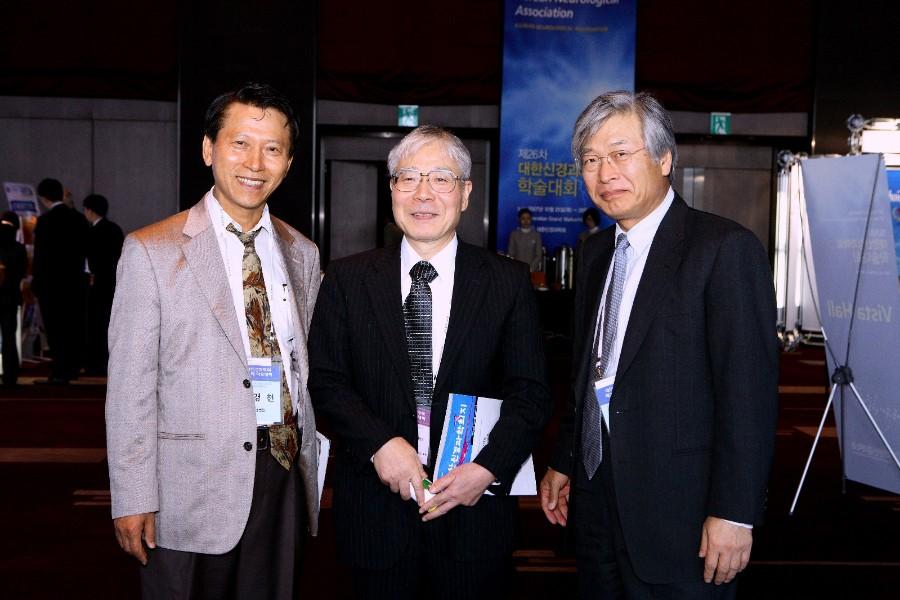
교수님께서 많은 전문과목 중에 신경과를 선택하시게 된 계기와, 신경과 파트 중에서도 뇌전증을 주로 전공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요?
제가 대학생 때에는 이수익 교수님께서 신경과를 담당하셨다가 미국 버지니아 의과대학 교수로 부임하시면서, 커다란 공백이 생기면서, 신경과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급격히 대두되기 시작한 시기 이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 후에 미국에서 좀 더 발전된 학문을 배우고 경험한 후에 귀국하여 모교에서 진료와 교육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신경과를 전공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미국에서 내과 전공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원래는 내과 전문의를 마친 후에 신경과를 해 볼 생각이었는데, 내과 1년차 때에 이명종교수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마침 미네소타 대학에 전공의 1년차 자리가 갑자기 비었으니, 빨리 응시를 하라고 하셔서 딴 생각 없이 신경과 전공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신경과의 세부 전문분야 중에서도 뇌전증이 가장 중요하고 인기가 높은 분야 이었습니다. 새롭게 발전된 뇌전증의 수술 프로그램과, 24시간 비디오뇌파검사, 항 뇌전증 약물의 혈중농도 측정과 임상약리학의 발전을 기반으로 한 단독약물요볍이 대세였던 시기로서 뇌전증의 종합적 진료 프로그램의 설립이 화두가 되었던 시기 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전임의 교육을 받았던 클리브랜드 크리닉도 이 시기에 새롭게 설립된 뇌전증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의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이 고등학교 1년 때에 뇌전증으로 사망했던 것이 저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는데, 당시의 뇌전증은 우리나라에서 숨기는 질병으로 취급되어 적극적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질병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경험한 뇌전증의 종합적 진료활동은 저에게 매우 신선한 충격을 주었으며, 다른 분야보다도, 뇌전증을 전공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불모지나 다름없던 국내 뇌전증 치료의 선구자로 불리는 교수님께서는 연세대 의대를 졸업 후 1979년 미국으로 건너가 클리블랜드 클리닉 전임의, 인디애나대학병원 교수로 근무하시며 뇌전증 치료의 선진 경험을 쌓으셨는데, 당시 미국 유학 생활에서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클리블랜드 크리닉에서 전임의 과정을 시작했을 때에, PROGRAM DIRECTOR 이던 HANS LUDERS 교수님께서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SUBDURAL GRID 를 뇌전증 수술프로그램에 채택하셨고, CRANIOTOMY를 하고, GRID ELECTRODE를 넣은 다음에, EEG RECORDING 뿐만 아니라 ELECTRICAL STIMULATION 을 하면서 BRAIN MAPPING을 하였는데, 환자가 아주 힘들어 하는데도, 자세한 뇌기능 검사를 위해서 반복적으로 여러가지 행동을 하도록 시키고, 종용하는 과정이 매우 인상깊었는데, 당시 우리는 이를 “BLOODY LAB” 이라고 불렀습니다.
전임의 과정을 마치고 인디아나 대학에 부임하면서 뇌전증 수술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처음에는 구입은 했으나 수 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VIDEO-EEG machine을 발견하게 되어서 이를 이용하게 되었고 EPILEPSY MONITORING UNIT가 없어서 환자를 아침에 EEG LAB으로 불러서 MONITORING을 시작하고, 오후 5시에는 다시 병실로 보내는 방식으로 epilepsy monitoring 을 시작하였는데, 입원 기간 동안에 SEIZURE를 한번도 기록하지 못하고 결국 퇴원시켰던 환자가 있었는데, 입원 마지막 날 오후 5시까지 놔파를 기록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병실로 이동하는 도중에 그렇게 기다리던 SEIZURE 가 발생하여 너무 아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적절한 진료를 위해서는 의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시설과 장비의 운영 체계가 잘 갖추어져야만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닿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국내 처음으로 ‘뇌전증 전문 클리닉’ 개설, 뇌혈류검사를 통해 경련을 일으킬 때 혈류가 증가하는 원리를 이용, 뇌전증 수술 시 병소를 정확히 짚어내는 방법을 세계 최초로 고안, ‘간질’용어를 ‘뇌전증’으로 공식명칭 변경 하는 등 정말 많은 업적들이 있으십니다. 이런 다양한 업적들을 이루실 수 있게한 원동력이 있다면 무엇인지, 또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결국 필요하고 원하면 얻게 된다 (궁즉통; 窮則通) 이라는 말이 있듯이, 처음에 인디아나 대학에서 수술프로그램을 시작할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21- channel VEEG machine (Telefactor) 밖에 없었고, intracranial EEG를 시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seizure focus를 찾기 위한 다른 검사 방법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침 핵의학교실에서 I123 동위원소를 이용한 뇌혈류 검사를 시행하고 있었기에 이 동위원소의 특성에 착안해서 발작시 와 발작간 촬영을 시도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가 매우 훌륭하게 나왔습니다 귀국 시에는 아직 우리나라에 VEEG machine이 소개되지 않았던 때였는데, 마침 Telefactor 사장께서 방한하게 되었고 이때에 21 channel VEEG machine을 1년 동안 데모 용으로 기증을 받아서 세브란스 수술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간질 용어를 뇌전증의 공식명칭으로 변경한 것은 제 능력이기 보다는 뇌전증학회 회원님들 모두의 노력에 의한 것입니다. 특히 당시 이상도 학회장과, 허균 교수, 이상암 교수, 신동진 교수 등이 중심이 되었으며, 이를 후임 회장단에서 이어 받아서 이 작업을 완성 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용어 변경 작업은 매우 체계적으로 또한 단계별로 진행되었고, 국제 뇌전증학회와 협회에서도 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결과를 보면, 매우 성공적인 작업이었고, 이로 인하여 우리 뇌전증학회의 국제적 위상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현재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모두가 간질 보다는 뇌전증이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 작업은 진행중에 있으며, 의학적 용어, 법적 용어의 단계를 거쳐서, 현재는 사회적 용어의 단계로서, 뇌전증이라는 용어를 우리 사회에 완전히 정착시키는 과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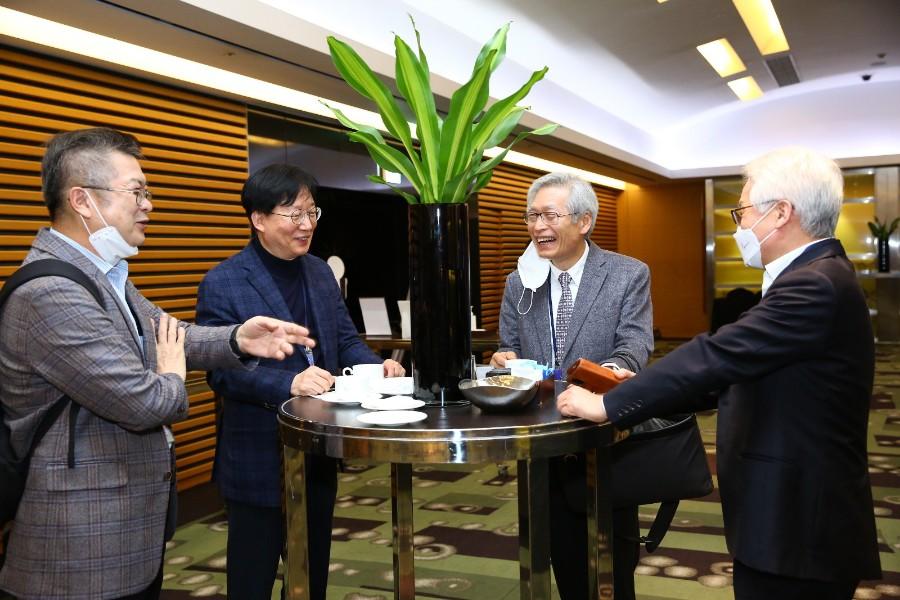
인터뷰 마지막으로 대한신경과학회, 후학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신경과라는 학문은 정말 매력적인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그 시작이 많이 늦었는데, 그 이유는 신경계가 워낙 복잡한 장기이기 때문이며, 일반적인 인간의 사고와 지식으로는 접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신경계라는 복잡한 장기를 분석할 수 있는 컴퓨터라는 도구와 수단이 마련되면서, 신경과학의 비약적인 발전이 거듭되었는데, 4차 혁명의 주체인 인공지능이 바로 신경계 회로와 특성를 적용한 사례입니다. 향후 인공지능이 발전할수록 신경계 질환 뿐만 아니라, 뇌 기능의 기전을 알게 될 것이며, 뇌질환의 치료 뿐만 아니라 뇌기능을 발전시키는 창의적 방법들이 개발될 것이고 이는 결국 인간의 진화로 이행 될 것입니다.
우리 신경과 의사들은 이 과정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개개인이 담당하는 분야와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나 특성들은 미래의 신경과 의사의 역할에 대한 주관적 견해의 확립과 이를 위한 준비, 노력 및 능력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학회 역시 이러한 미래를 위한 작업과 투자를 지속하면서 회원들과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